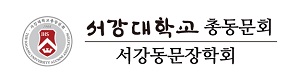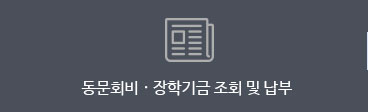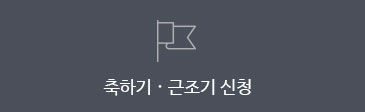“후회없는 연극인의 길 열어준 또 한 분의 아버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4-01-05 14:01 조회11,68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후회없는 연극인의 길 열어준 또 한 분의 아버지"
이근삼 교수님 영전에 띄우는 글
지난 11월 2 8일 캄캄한 초겨울 새벽, 선생님을 모신 운구차가 영안실을 떠나 마지막 미사를 위해 성당으로 향했다. 성당에 도착해 미사를 시작할 즈음, 성당 밖은 훤하게 밝아져 초등학생들이 재잘거리며 등교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선생님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가 끝나고 선생님을 모신 관이 문 옆에 세워져있던 강의 중의 생전 선생님사진 곁을 지나는 순간 가슴이 꽉 막히며 울컥 눈물이 쏟아졌다. 선생님이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영안실에 도착해 밝게 웃고 계시는 선생님 영정 앞에 엎드려 절하다 북받치는 감정에 팔이 떨려 몸을 일으키기 힘들었을 때처럼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가 너무도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리라.
이제는 도저히 이어질래야 이어질 수 없다 느껴졌기 때문이리라. 선생님께서는 다시 화장장으로 옮겨지시어 한줌의 재로 화하시었다. 자그마한 유골단지 안에 선생님이 담겨졌다. 너무도 자그마한 하나의 단지 안에. 그
리고 천안의 야외묘지에 앞서 세상을 떠난 아드님과 함께 묻히시었다. 하늘은 맑았다. 사방은고요했다. 넓디넓은묘역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조객들과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나뭇잎들 뿐으로 여겨졌다. 당신이 오셨던 자연 속으로 되돌아가시는 것이라 애써 자위해보아도, 살아움직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고 설득해 보아도 왜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으로만 여겨지는지, 아직 나는 삶과 죽음
모두 자연의 순환이라는 얘기를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자에 불과했다.
내가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대학입시 면접 때였다. 아직도 그때 선생님의 첫 질문이 기억난다. “자네 고등학교는 제대로 졸업했나?” 글쎄, 그때의 내가 그토록 어려 보였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삼수생답게(?) 불량해보였기 때문이었는 지는 지금도 알 길이 없다. 입학해서는 ‘극작법’ 수업시간을 통해 선생님을 가까이 뵙게 되었는데 이 수업은 선생님의 존재가 나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학기말 과제물로 제출한 단막극을 읽어보시고 약간의 수정을 가해 신춘문예에 응모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으니 말이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연극을 일생의 업으로 택할 생각 같은 건 꿈에도 없었고, 또 게을러 빠졌었기에 신춘문예 응모는 당연히 하지도 않았지만, 그 후로도 선생님께서는 두고두고 희곡 쓰기를 은근하게 종용하시곤 했다. 연극인의 삶을 살고는 있으나, 그면에서는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린 셈이 되고 말았다.
선생님께서는 진정 제자들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분이시기도 했다. 정초에 처음으로 세배차 댁으로 찾아뵈었을 때 선생님께서는 취미로 해외여행 때마다 수집한 것들이라며 각양각색의 재떨이를 우리들 앞에 하나씩 놓아주시고 재떨이 사용을 권하였다. 어린 우리들이 선생님 앞에서 담배를 편히 필수 있도록 하시려는 뜻이 숨어있었다는 걸 깨닫게된 건 그 후로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다. 이러한 선생님의 자유로운 교육방식 덕분에(?) 연극계에 나가서도 어른들 앞에서 태연히 맞담배질을 하다 가 야단을 맞는 경험도 겪었긴 하지만. 졸업 후 내 결혼식 때의 선생님 주례사도 선생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였다. 나에 대해 “성적은 볼일 없었고, 강의실 보다는 메리홀로 출근했고, 머리 깎고 감은 모습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다”는 등등의 말씀으로 처갓집 식구들을 기절초풍하게하셨으니 말이다. 허나 그 말씀의 밑바닥에는 연극에 푹 빠져있는 제자에 대한 사랑이 깔려있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이런 선생님을 학교 밖의 세상에 나와서는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계속 연극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느냐는 핑계로. 또 그 길을 가다보니 너무 힘든 일이 많아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그러면서도 특히 선생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죄스런 마음을 늘 지울 수 없었던 건, 연극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단 한번도 선생님의 희곡을 내 손으로 무대화하는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생님께서 정년퇴임 후 다시 활발하게 극작을 하시면서 세상에 내놓으신 ‘화려한 가출’에 내 처가 출연하는 기회를 가진 일이었다. 그 공연으로 다소나마 마음의 빚을 갚은 듯한 기분이 들었으나, 그것이 끝이 되고 말았다. 그 후 연극인 부부인 나와 내 처를 위한 희곡을 써주시겠다던 선생님의 약속마저 이제는 지켜질 수 없게 되었고.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힘은 들지만 후회는 없는 나의 연극인의 길을 인도해주신 분이셨다. 나의 삶에 또 한 분의 아버지셨다.
이제 선생님 작품으로 선생님 생전 마지막 공연작품이 된 ‘어느 노배우의 마지막 연기’의 마지막 대사를 여기에 옮겨 보며 선생님을 보내드린다.
"자, 나는 이제 정말 쉴렵니다. 나의 지금 기분은 마치 공연이 끝나면 늘 느끼는 그런 기분입니다. 막이 내리고 관객이 나가고 우리는 분장실에서 분장을 지우고 옷 갈아입고 밖에 나가면 마음이 썰렁했습니다. 누구도 기다려 주지 않는 잠자리를 향해 어두운 밤거리를 걸어갈 때의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이런 썰렁한 느낌 속에서 이를 달래며 걸어가는 긴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자! 나는 모든 걸 잊고 영원한 망각의 공간을 향해 발을 옮기겠습니다. 나를 외면한 사람들 그리고관객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김철리(73 신방)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이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