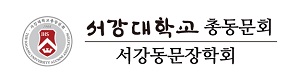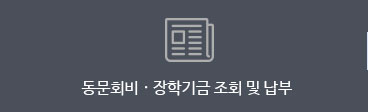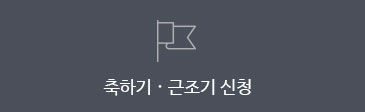칠하기와 우표붙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2-11-08 06:11 조회22,01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교실 문짝과 우표
가난한 학생 배려한 '부자 미국 학교'
40년 전 여름, 학교가 텅텅 비었던 무렵이니 방학중이었겠고, 새로 지은 C관에서는 칠냄새가 코를 찔렀고, 언제나 그렇듯이 교정은 적막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한양대학교의 대학원장이 되어버린 손정식 교수와 나는 불안한 학창시절의 한 토막을 보내던 중, 교실마다 문짝에 번호를 매기느라고 바빴다.
방학이면 손정식은 본관 입구 교환실에 앉아 전화를 받는 일을 했고 나는 영어 소설을 쓰느라고 늘 도서관에서 나날을 지냈으며, 학교의 영선업무를 맡았던 오수사는 그렇게 방학에도 줄창 학교에서 버티고 지내는 우리 두 사람을 보고는 일을 시키기로 했던 것이다. 교실 번호를 문짝에 적어 넣는데, 문 하나에 그때 돈으로 10원을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페인트와 붓과 휘발유와 의자를 끌고 다니며 우리 두 사람이 적어놓은 교실 번호는 언젠가 가서 보니 C관 한쪽 구석 어학 실험실과 쪽창고에만 몇 개 남았더니, 이제는 그나마도 모두 없어졌으리라는 생각이다.
칠장이를 불러다 일을 시켰더라면 훨씬 더 좋은 솜씨가 나왔겠지만 굳이 그렇게 우리들더러 번호를 적어 넣게 했던 까닭은 아마도 가난한 우리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혜택을 주려고 했던 학교의 정책 때문이었으리라고 믿는다. 당시 ‘우리학교’에는 그렇게 구석구석 일자리가 있으면 재적생들에게 적으나마 보수를 주면서 맡겼고, 학생들 대부분은 그것이 ‘정책’이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
나를 포함하여 많은 학생들이 서강대학교로 갔던 까닭은 등록금이 싸고 장학금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소를 팔아 대학을 보내야 했던 어려운 시절, 너도나도 평등하게 가난했던 아이들은 미국 신부님들이 가르치는 서강대학교는 “부자 미국 학교”라는 애매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막상 입학하고 보니,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중앙식 난방시설에 “수세식 변소”까지 갖추었으며, 어학 실험실 같은 첨단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학교였다.
그리고 복도를 어찌나 반들반들하게 청소를 계속하는지, 정말로 부자 학교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어느 신부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런저런 장학금을 제하고 나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는 청소부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하다고 했다.
서강대학교는 그렇게, 정말로 정말로 부자 미국 학교였다.
서강대학교는 그렇게, 정말로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학교였다.
그리고는 또 어느 해 방학 때, 학교에서 줄창 살다시피하던 학생들 몇 명이 본관 2층의 도서실 및 교실로 불려가 모여 앉아 잔뜩 쌓아놓은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이는 일을 했다. 돈을 얼마씩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무보수 작업은 아니었다.
미국의 전역으로 보내는 그 수많은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누군가 물었고, “큰 데일리 신부님”이라고 믿어지지만, 누군가 그 봉투에는 미국에 사는 후원자들에게 기부금을 부탁하는 ‘구걸 편지’가 들었다고 했다.
서강대학교는 그렇게, 수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모은 돈으로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다. 지금이야 학생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등록금도 꽤 많겠지만, 전교생이 백여 명에 불과했던 시절, 서강대학교는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는 또 썼다.
나도 서강대학교 4년을 다니며 낸 돈(學費)이 별로 없었다는 기억이다. 문짝에 번호를 써넣고 우표를 붙인 ‘품삯’ 정도밖에는 되지 않으리라.
그리고는 40년이 지났고, 내 나이도 환갑이 지났고, 서강대학교도 나이를 먹었다. “어머니 노릇을 했던 학교(alma mater)” 서강도 이제는 중년이 되었고, 많이 지쳤으리라는 생각이다.
아마도 서강이 키워낸 ‘자식’들이, 옛날에 신부님들이 우표를 붙이게 해서 모아들였던 학교 운영비처럼, 적으나마 너도나도 돈을 모아 동문회관을 지어, 지친 중년의 서강에게 바치려고 하는 까닭은, 서강이 우리들을 자랑으로 여겼듯이 우리들 또한 서강을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자그마한 힘이나마 학교를 위해 보탤 만큼 우리들이 이렇게 자랐다는 사실은 전후의 가난했던 시절 우리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주었던 ‘어머니(mater)’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정효(61·영문) 소설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