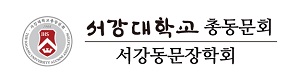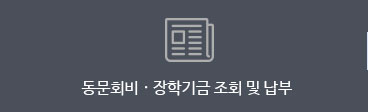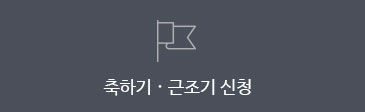땀흘리며 자아캐는 엄정식(60.철학) 동문의 사색의 안식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3-05-13 11:05 조회20,64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이준희의 세상속으로] 땀흘리며 자아캐는 '사색의 안식처'
2003/05/12 (한국일보)
서해안에 인접한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의 은곡마을. 야트막한 산들이 종이학처럼 곱게 접혀있는 작은 마을이다. 그 한쪽 갈피 언덕배기에 낡은 농가 한 채가 숨 듯 올라앉았다. 오르는 길은 고작 두어 명이 어깨를 맞댈 수 있을 만큼 좁다. 집 안팎의 잡초들은 온통 발목을 휘감고 툇마루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였다.
오월의 햇살이 적요한 금요일 오후. 오솔길 잡목 터널을 헤쳐 올라온 승합차 한대가 뒤뚱거리며 뜰에 들어섰다. 검은 뿔테 안경만 아니라면 영락없는 농부 행색인 운전자가 내렸다. “아이구, 벌써 왔어요? 오는데 고생 안했어요?” 손님을 반기는 표정과 탄성이 어린아이처럼 도무지 티가 없다.
은곡재(隱谷齋)라고 이름 붙여진 이 집의 주인 엄정식(嚴廷植·61·철학과) 서강대 대학원장이다.
흙 묻은 고무장화에 바짓가랑이를 접어 넣은 엄 교수는 집 안팎의 먼지를 아무렇지 않게 손으로 쓸어내고 차에서 짐을 부렸다. 책 몇 질은 마당 한 켠에 쌓아놓고 아내가 플라스틱 찬합에 챙겨준 며칠치 먹거리는 부엌에 들여놓았다. 나머지는 대개 골판지 따위의 잡동사니들이다. “다 서울 목동아파트 집에서 남들이 내다버린 걸 주은 거에요. 여기 있는 물건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집에는 집만큼이나 오래 된 물건들로 꽉 차 있다. 여기저기 많이도 걸린 시계들은 하나같이 먼지와 거미줄을 뒤집어쓴 채 제멋대로인 시각으로 멈춰있고 흙벽에는 난데없는 이발소 거울도 붙었다. 예전 교무실에서나 쓰던 일정표 칠판이 매달렸는가 하면 틀어도 소용없을 것 같은 고물 TV에, 30년도 더 지난 듯한 일제 파나소닉 라디오에, 줄 끊기고 칠 벗겨진 기타에, 이 빠진 소반에…. 가까운 철학교수들이 와서 보고는 “쓰레기를 갖고 별장을 만들었다”고 기막혀 했을 정도다. 하도 주워 담으니까 이젠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사철이면 “교수님, 물건 나왔습니다”라고 먼저 연락을 한단다. 그가 여기서 글 쓸 때 쓰는 책장이나 의자 등도 그런 것들이다.
“도대체 이런 잡동사니들을 왜 소유하려 듭니까” 생각없이 던진 질문에 철학자다운 대답이 돌아왔다. “소유란 게 뭡니까. 그냥 아까워 못 버리고 갖고 있다면 그게 소유입니까? 중요한 건 자연적인 것이지요. 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無所有)는 오히려 작위적이에요.”
학교일이 너무 바빠 이번에는 3주 만에야 내려왔다는 엄 교수는 집 안팎을 손보고 안내하며 한껏 들떴다. 마치 오래 헤어진 연인을 만난 표정이다.
툇마루에 걸터앉아 늦은 점심을 챙겨먹으면서도 눈에 들어오는 풍경에 연신 감탄사를 멈추지 못한다. “이 투명한 신록을 보세요. 아, 저 역광을 받고 선 나무 좀 봐요. 너무 재밌죠.” (‘재미있다’는 엄 교수 특유의 ‘멋있다’ ‘좋다’는 표현이다) 건너 편 산자락의 김씨 할아버지가 오랜만의 인적을 반겨 찾아와서는 점심상의 막걸리를 한잔 얻어 마시고 휘적휘적 내려갔다.
그가 이 오래 된 농가와 인연을 맺은 지는 벌써 열여섯 해나 됐다. 5공 정권 말기인 87년 초여름. 학생처장을 맡아 감옥에 갇힌 제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러 전국을 한바퀴 돌 때였다. 마지막 일정까지 마치고 지친 몸으로 대전에 도착했을 때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다. 너무 어릴 때 여의어 기억마저 희미한 아버지. 5대 독자로서 무려 일곱 딸을 낳은 끝에 중년을 넘겨서야 기어코 6대 독자인 그를 얻고는 돌아가신 아버지였다. 그는 무작정 아버지의 고향 당진행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는 읍내 복덕방을 찾았다. “조용히 글쓰고 생각할 만한 곳이 어디 없겠습니까.” 그 복덕방에서 찾아준 곳이 이 집이었다.
산자락 깊숙히 서너 집 밖에 없어 그냥 ‘숨은 골’로 불리던 적막한 마을. 150년은 족히 넘었다는 ‘ㅁ’자형 토담집은 말 그대로 폐가였다. 무너진 흙벽을 메꾸고 지붕이 기운 툇마루에는 나무기둥을 찔러 넣었다. 곧 쓰러질 외벽 한편은 자키로 버텨 세우고 부엌 아궁이도 불길이 잘 들게 손보았으며 뒤뜰에 축대도 쌓았다. 온갖 수목이 넉넉하게 감싸안은 널찍한 뜰에는 작은 연못도 팠다. 마을 이름을 딴 은곡(隱谷)이라는 아호(雅號)도 얻고 절친한 이명현(李明賢·전 교육부장관) 교수는 집에 은곡재(隱谷齋)라는 그럴듯한 이름도 붙여 주었다. 그렇다 해도 오래 비운 뒤 끝의 집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폐가에 가깝다.
엄 교수는 한달에 두어 번씩 틈나는 대로 이 곳에 혼자 내려와 며칠씩 머문다. 온전히 ‘서울 촌놈’이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어설프게나마 농사도 짓는다. ‘교수님’답지 않은 소탈함에 일찌감치 마음을 연 이웃은 벌써 그의 계단 논을 갈고 물도 채워 두었다.
그의 은곡재 생활은 도시인들이 흔히 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