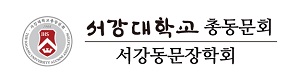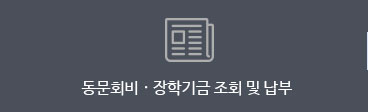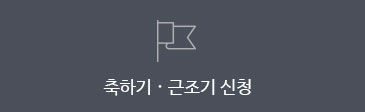김성오(63.경제)우성해운 부산소장 국제신문 인터뷰 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4-03-10 18:03 조회22,04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이사람의 삶] 우성해운 부산소장 김성오씨
<국제신문 독자광장 인터뷰>
“부산항이 세계적 컨테이너 처리항으로 발돋움하는데 보탬이 됐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30여년간 외국선사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남모르게 겪어야 했던 가슴아픈 기억도 하나 둘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세계적 선사인 짐(ZIM) 한국대리점인 우성해운(주) 부산사무소 김성오(59) 소장.
부산 출신인 그는 대학을 졸업하던 1967년 당시 대만 선사와 거래하던 한 선사 대리점에 첫발을 디딘 이래 올해로 36년째 부산항과 질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김 소장이 짐과 인연을 맺은 것은 친분이 있던 우성해운 간부의 권유로 지난 1974년 회사를 옮기면서부터. 그후 그는 강산이 세번이나 바뀌는 짧지 않은 세월동안 외국 화물선과 부산항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김 소장은 1960년대 후반 이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부산항과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변천사 등을 직접 두 눈으로 지켜봤다.
그는 자성대부두가 들어선 1982년 이전만 해도 부산항에는 일제때 축조된 일반부두를 빼면 제대로 된 부두시설은 물론 하역장비도 전무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수출입 상품 대부분을 노무자들이 어깨에 메고 날라야 해 2천t급 화물선이 입항하면 하역작업에만 꼬박 한달이 걸리기가 일쑤였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수출상품도 전자제품이 등장한 1980년대 이전에는 대만과 일본에 건축용자재로 수출되던 돌과 흙 못 무연탄 석회석 신발 의류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수만t의 화물을 불과 10여시간만에 처리하고, 첨단 전자제품들이 수출 주종품으로 자리잡은 지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털어놨다.
김 소장이 부산사무소 직원 30여명과 함께 지난해 부산항에서 처리한 회사소속 컨테이너 물량은 20피트짜리 30만개. 이는 지난해 부산항에서 처리한 전체 물량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동북아허브항을 꿈꾸는 부산항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분량이다.
이제는 본사의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지만 불과 3~4년전까지만 해도 본사의 일방적인 지시와 양국간 문화차이 등으로 적잖은 속앓이를 해야 했다.
부두에 도착하지 않은 화물을 막무가내식으로 선적하도록 요구하거나 본선이 스케줄보다 늦게 도착하고도 “왜 접안이 안되느냐”고 항의할 때는 괴롭기 짝이 없었다.
외국선사 대리점에 발을 들여 놓은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본사 관계자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얘기는 “역시 한국사람들이 일을 제일 잘한다”는 말이다.
김 소장은 다른 나라 대리점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제한된 시간내에 양적하 작업을 끝내기 위해 밤늦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또 체선 등으로 하역에 차질이 예상되면 미리 본사에 통보, 대비하도록 만전을 기한다.
그는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본사가 한국보다는 물량이 급증하는 중국에 더 신경을 쓰는 터에 최근 화물연대의 두차례 파업까지 겹쳐 안타깝기만 하다.
김 소장은 “예전에는 배가 항해 도중 기상악화로 운항스케줄이 지연돼도 부산항에는 꼭 들렀는데 지금은 빼먹고 중국으로 가는 경우가 잦다”면서 “이같은 현상을 되돌려 놓기 위한 특단의 대책없이는 부산항이 동북아허브항으로 발돋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일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