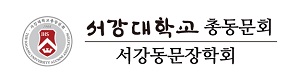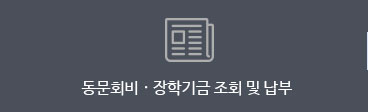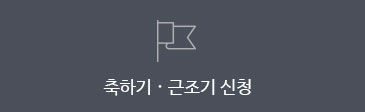서강 후배들이 추억하는 스승 故장영희 교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03 11:01 조회15,14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서강학보 제552호(2009년 5월 25일 발간)에 고 장영희 교수를 기리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강학보사의 양해를 구해서, 총동문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
故 장영희, 교단 위의 그녀를 기억하며…
지난 13일 우리학교 성이냐시오 성당에서 故 장영희 교수(영미어문학·미국문화학)의 장례미사가 열렸다. 성당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고자 하는 500여 명의 사람들로 가득했다. 한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평생을 불편한 몸으로 살아간 故 장 교수는 신체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 이에 서강학보는 제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수 장영희의 삶을 되돌아봤다. <편집자주>
내 인생의 참 스승 故 장영희 교수
김재엽(경영 98) 동문과 故 장영희 교수와의 첫 만남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김 동문이 월간지 <영어세계>의 ‘번역교실’ 문제에 응모해 입상했을 당시 故 장 교수가 심사를 담당했었다. 그 일을 계기로 김 동문은 <코리아 타임즈>에 기고된 그녀의 칼럼을 읽기 시작했다. 이듬해 다른 학교에 입학한 그는 평소 동경했던 故 장영희 교수를 직접 찾아갔고 이후 이메일을 통해 인연을 이어갔다. 1999년 김 동문은 우리학교 편입시험에 통과했다. “故 장 교수의 제자가 될 기회”라는 생각은 그에게 높은 경쟁률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줬다. 비록 영문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김 동문은 故 장 교수가 강의하는 ‘번역연습’ 등을 수강하며 가르침을 아로새겼다.
그에게 있어 故 장 교수는 학문적 스승일 뿐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었다. 그는 그녀를 “부모나 친구에게 알리지 못하는 고민까지 털어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라 말한다. 졸업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직접 만나는 횟수는 줄었지만 메일을 통해 꾸준히 연락하던 그는 마지막 메일을 기억한다. “재엽아, 화이트데이 잘 보냈어? 난 지금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단다. 네가 준 좋은 기회였는데 말이야. 내년을 기약하고 열심히 노력하자. 너도 나도.” 금년 3월 화이트데이 때 청한 식사대접에 대한 답신이었다. 하지만 내년을 기약하자던 그녀는 두 달 뒤 부음 소식으로 김 동문을 찾아왔다. “故 장 교수의 제자일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하는 그는 “故 장영희 교수는 내 인생에서 단 하나뿐인 참 스승이며 故 장 교수와의 인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을 것이다”고 말을 마쳤다.
진정한 교육자였던 은사 故 장영희
박용철(법학 94/서강대 법학과 교수) 교수는 故 장영희 교수를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대다수의 학우들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익숙지 않았던 시절, 故 장 교수는 학우들을 실력이 아닌 노력으로 평가했다. 그는 “꾀를 부리다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자들의 안이함을 깨우쳐주기 위한 고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당시를 반추했다. 박 교수는 유학 생활 중에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그녀를 찾았다. 그는 “자주 뵙진 못했지만 고민거리가 생기면 주저 없이 故 장 교수를 찾았다”며 “그녀는 내 인생의 최고의 멘토다”라고 덧붙였다.
故 장영희 교수는 제자를 마음으로 품어주곤 했다. 제자였던 박용철 교수가 우리학교 교수로 부임하자 그녀는 “네가 내 아들 뻘이니 네 제자들은 내 손자들이 아니냐”며 박 교수의 부임을 내 가족의 일처럼 자랑스러워했다. 교수로서 故 장 교수와 같은 길을 걷게 될 박 교수는 “고인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자이자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는 조언자였다”며 “제자이자 후배 교수로서 故 장 교수의 모습을 따라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학생을 사랑한 교수 故 장영희
신진석(영미문화 02) 학우는 2003년 영문학개론 수업을 통해 故 장영희 교수를 알게 됐다. 당시 전공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은 신 학우가 교수를 찾았고 그렇게 인연은 시작됐다. 故 장영희 교수의 교육철학은 ‘공부는 즐거워야 한다’였다. 이에 생전 故 장 교수는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수업을 추구했다. 신 학우는 “영어 연극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영어 단어나 문장을 연극을 통해 즐겁게 암기했다”고 말했다. 그에게 故 장 교수의 교육 방식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다. 故 장 교수는 교수와 학생의 친분도 중요시했는데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함께한 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실제로 고인의 책상에는 제자들과 함께한 사진들로 가득했다. 장례식을 찾은 조문객 2000명 중 대부분이 그녀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은 학생들을 사랑한 故 장 교수의 모습을 반증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오뚝이 수필가로 기억하지만 내가 아는 故 장 교수는 오뚝이가 아니다.” 오뚝이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장난감이지만 그가 기억하는 故 장영희 교수는 결코 쓰러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신 학우는 “그녀는 세상에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겨도 잘 견뎌낼 사람이었다”며 “그런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타계 소식은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 곁에서 사진기를향해 소녀처럼 활짝 웃으시던 교수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그녀를 그리워했다. 그는 “故 장 교수의 가르침을 늘 잊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며 마음을 남겼다.
故 장영희 교수는 유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나는 지금 내 생활에서 그것이 진정 기적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특유의 유쾌함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간 故 장영희 교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김유원 기자 yuwon@sogang.ac.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