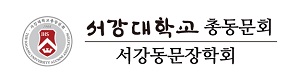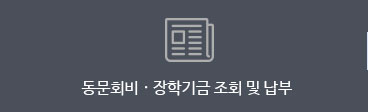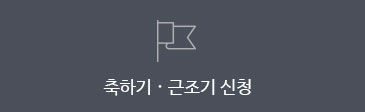"로욜라 도서관이 심어준 학교 도서관의 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25 17:26 조회14,80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광복(89.철학) 서울 중동고 철학교사
사범대가 없는 서강의 특성상, 교직 사회에서 동문 교사를 만나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럼에도 유독 학교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서강 출신 선생님들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개중에는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 회장을 맡고 있는 허병두(81.국문, 숭문고 국어교사) 선생님을 비롯하여 ‘학교 도서관의 산 역사’ 라고 할만한 분들도 적잖다.
플라톤의 ‘국가’ 에는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나온다. 동굴 안에는 죄수들이 묶여 있다. 이 죄수들은 동굴의 막다른 벽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벽에는 죄수들의 등 뒤를 오가는 사람과 사물들의 그림자들이 비치고 있다. 어느 날 죄수 중에 한 명이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한다. 밧줄을 풀고 동굴 밖으로 달려나간 그는 그림자가 아닌 실제 물체들을 바라보았다. 밝은 빛에 익숙해지자, 마침내 태양을 쳐다보며 그림자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죄수는 다시 동굴로 내려온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에게 자신이 본 ‘진짜 세계’에 대해 이야기 해 주었다. 그러나 평생 그림자만을 바라본 죄수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진실을 말한 죄수는 비웃음만 살 뿐이었다.
1989년, 대학에 입학하여 로욜라 도서관을 처음 접한 나는 ‘밧줄에서 풀려난 죄수’와 똑같은 느낌이었다. 당시에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개가식 서가, 전산화된 대출반납 체계, 편리한 각종 서비스들....... 닭장 같은 자습실 밖에 모르던 나에게 로욜라 도서관은 말 그대로 ‘도서관의 이데아’로 다가왔다.
거꾸로, 교사가 되어 고등학교로 돌아갔을 때 내 심정은 다시 동굴로 내려간 죄수의 심정 그대로였다. 대학 시절 내내 도서관의 편리함과 유용함에 익숙해 있던 나에게 눈가리개 같은 칸막이들만 가득한 자습실은 상상력을 제약하고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감옥으로 다가올 뿐이었다. 아마도 교직에 진출한 서강 출신이라면 무너지거나 사라져버린 학교도서관을 보며 나와 비슷한 처연함을 느꼈을 터이다.
도서관은 그 자체로 지적 욕구를 자극한다. 시설 좋은 축구장이 있다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축구가 하고 싶어지는 법, 양서(良書)로 가득한 도서관도 지식에 대한 갈증을 저절로 불러일으킨다. 또한, 도서관은 좋은 상담자이기도 하다. 몸에 당장 필요한 양분이 든 음식을 보면 입맛은 저절로 살아난다. 마찬가지로 서가를 거닐다 보면, 내 마음 속에 갈등에 해답을 주는 책들은 저절로 눈에 와 꽂힌다. 도서관은 영혼의 힘을 기르는 휴식 공간이기도 하다. 조용함 속에서 번잡함을 지우며 책이 던지는 물음을 따라가다 보면 자성(自省)과 깨달음이 가슴을 때리곤 한다.
로욜라 도서관은 나에게 이 세 가지 가르침을 모두 주었다. 나아가 서강 출신들이 지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사회의 평가를 듣는 데에는 도서관이 큰 역할을 한다고 나는 강변하고 싶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과 관리자 처지는 다르다. 이제는 관리자 입장이 된 나에게 도서관은 결코 조용한 곳만은 아니다. 사서 한 분이 계신 장서 1만 5천 여 권 남짓의 작은 학교 도서관일 뿐이지만 업무의 양은 결코 적지 않다. 판단을 내려야 하는 현안들도 솔잖게 일어나곤 한다. 그럴 때면 나는 로욜라 도서관을 찾아가 곳곳을 둘러보곤 한다. 모교 도서관은 나의 영원한 스승인 동시에 ‘실전 업무 매뉴얼’인 셈이다.
아울러, 세월이 흐를수록 로욜라 도서관에 얽힌 추억도 날로 새로워만 진다. 3.5층(지금의 1관 4층) 층계참에서 바라보던 한강변의 노을, 수족관에서 밤샐 때 벗이 되어 주었던 의기촌의 자판기....... 상념은 끝이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운 건 사람이다. 도서관에서 늘 같이 공부하며 ‘팩차기’를 차던 철학과 친구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