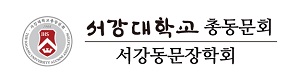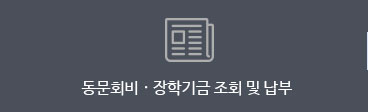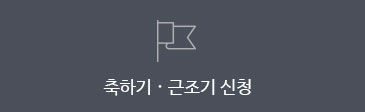[김경주(02 철학)시인] - “시는 쓰기보다 지우기, 詩作의 설렘 너무나 소중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선비 작성일09-12-20 23:03 조회16,55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실험정신이 희박해지고 있는 한국 문단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꾸준히 모색해 온 김경주(02 철학, 본명 김병곤) 시인을 만났다.
김경주 시인은 2003년 대한매일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에 시집『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2006), 『기담』(2008) 등을 상재했다.『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는 언어에 대한 자의식과 시간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연극적으로 결합된 시집으로, 언어의 높은 밀도를 자랑한다. 그는 두 번째 시집『기담』에서 첫 번째 시집에서 보여주었던 실험성을 한층 더 극대화하여 문학적인 개성을 보여준 바 있다. 최근에는 장정일을 비롯한 세 명의 동료 문인과 함께『숭어 마스크 레플리카』(2009)라는 제목으로 희곡집을 함께 펴냈다. 민음사와 계간『세계의문학』에서 주관한 제 28회 김수영 문학상의 수상 시집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사실 그는 평단과 대중의 지지를 받아온 사실에 대해서 거리를 취하는 편이다. 기질적인 겸손과 성실성 덕분이기도 하고 문학의 전위성을 지키려는 의지 덕분이기도 하다. 그는 작품을 쓰고 발표하는 것 외에는 문단 활동을 되도록 삼가는 편이다. 대신 매혹적인 것은 무엇이든 왕성한 식욕으로 잠식해버리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취지에서 김 동문은 문화 창작 집단 ‘츄리닝 바람’을 꾸리고 있다. 다양한 예술 장르에 심취한 이들이 모여 공동 작업이나 개별 작품 활동을 선보이고 있기에‘문화 게릴라’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단체는 미래의 예술을 현재형으로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다. 김 동문은 획일화된 주류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모색하는 데서 기쁨을 찾고 있다.
정주민보다는 유목민에 가까운 그는 상당한 시간을 한국 바깥에서 보낸다. 지금까지 200여곳이 넘는 도시를 여행했을 정도로 ‘떠돎’을사랑하는 그는, 방랑의 기록을 책『( Passport』,2007)으로도 묶었을 정도다. 어딘가를 향해서 부단히 움직이는 그에게 경계란 큰 의미가 없는 모양이다. 그는 시와 희곡의 경계, 문학과 문학 아닌 것의 경계, 국가와 국가의 경계, 이런 무수한 빗금들을 지워가는 중이다.
그는 여행을 떠날 때 사진기보다는 녹음기를 선호한다. 마치 영화 <일 포스티노>의 순수한 우체부 청년처럼 말이다. 사각의 네 귀퉁이에 빛의 그림자를 가두고 기억의 모서리를 잘라내기 보다는, 명암(明暗)이 불분명한 소리의 편린을 채집하는 편이 즐겁다는 이유에서다. 여행에서 돌아와 시간이 흐른 후, 녹음된 비둘기의 날갯짓 소리를 들으면 그 순간의 풍경이 퍼덕이며 되살아나는 듯 하다며, 김 동문은 녹음기와 함께 하는 여행 방식을 추천하기도 했다.
제도와 관습에서 자유로워 보이는 그가 서강대 철학과에 어떤 연유로 둥지를 틀게 됐는 지 궁금해졌다.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는 서강대에서 공부하는 동안 매일 도시락을 싸와 노고산에서 밥을 먹고 대부분의 시간은 로욜라 도서관에서 보냈다.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필요로 했던 그에게 서강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무척이나 편안하게 다가왔다. 흥미롭게도 그가 철학과에서 만난 동학들은 대부분 성직에 종사하는 이들이었다. 서로의 학문적 묵상을 격려해주는 관계를 맺으면서 김 동문은 지적·예술적 안목을 한층 성숙하게 가꿀 수 있었다. 지난 11월 19일 로욜라 도서관에서 미니 낭독회 공연을 여는 등 서강 공동체와 함께 문학과 예술의 즐거움을 나누려는 노력도 잊지 않았다.
지방에서 상경한 이후로 그는 꽤 다양한 직업을 거쳐 왔다. 김 동문은 “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 중의 하나는 철물점 주인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시와 산문에서 몸의 작은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현미경 같은 관심을 가져왔던 그에게 있어 손님이 세밀한 물품을 고르고 가져가는 철물점은 문학의 공간과 닮은꼴이다.
시집의 다채로운 세계만큼이나 정의하기 어려운 김경주 시인에게 시란 무엇일까.
“시는 쓰면 쓸수록 무언가를 쓰기보다는 지운다는 느낌이에요. 시를 쓸 때의 설렘은 너무 소중해서 아끼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 설렘을 평생 아껴가면서 즐기고 싶어서 등단을 망설인 적도 있었어요. 시는 저에게 영원히 하고 싶은 놀이같은 거예요.”
그의 놀이가 앞으로 더욱 즐거워지기를 바란다. 시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을 아끼는 독자들을 위해서도 말이다.
글=허윤진(99 영문) 문학평론가. 평론집『5시 57분』이 있음.
사진=정범석(96 국문)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