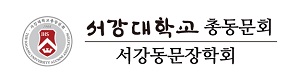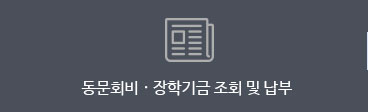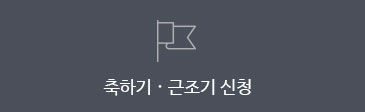서강인의 단골집 - 그대 6만 동문들의 추억이어라 - “사람냄새 물씬, 사계절 내내 귀향본능 자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07 00:52 조회19,85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개교 50주년 특집 기획 ‘그대 서강의 추억이어라’를 지난 서강옛집 367호에 이어 연재합니다. 1980년대 ‘글방 서강인’, 1990년대‘포시즌 호프’를 각각 해당 공간을 사랑했던 동문의 기억에서 되살렸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공간이지만 서강인들이 대학 생활의 낭만을 떠올릴 때 추억할 수 있는 단골 가게입니다. <편집자>
90년대의 추억 - 포시즌
학창 시절 술집 참 많이 다녔다. 1990년대 초반, 학교 정문과 청년광장을 바라보며 떡볶이 안주로 소주를 들이켰던 ‘물레야’, 모든 테이블이 투쟁가를 부르다가도 주인아주머니의 독창 때는 잠시 조용했던 ‘육교집’, 간판이 없어서인지 꼬막이 맛있어서였는지 여러 가지 설이 분분했던 ‘막집’, 라면이 맛있었던 ‘상림’, 과실로 만든 별주로 사람 여럿 쓰러뜨렸던 ‘사랑채’, 대학원에 들어가셔야 내 돈으로 먹을수 있었고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는 ‘동해횟집’, ‘노고산 숯불갈비’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내 단골로 삼았고 지난달에 들른 ‘투다리’와 ‘레이더스’ 등등…. 그럼에도 기억을 더듬어보니 90년대 내내 ‘포시즌(Four Season) 호프’에 충성했던 기간이 만 9년에 달한다.
쥐포 안주와 초고추장, 서비스 조리퐁 포시즌 호프는 서강대 정문에서 신촌 지하철역 방향으로 200미터 정도 내려가면 위치한 지금의 던킨도너츠 자리, 당시로선 글방 ‘서강인’과 전자오락실 사이에 있었다. 포시즌이 존재했던 10여 년간 네다섯 분의 사장님이 운영했다. 가장 인기 있던 안주는 88년경 처음 포시즌을 만들어 90년대 초반까지 운영한 이규신 사장님의 쥐포 안주였다. 90년 당시 1000원에 쥐포 다섯 장이 구워져 나왔는데, 다른 호프 집에서 내오는 것과는 맛이 비교가 안됐다. 쥐포 찍어먹는 묽은 초고추장도 맛있어서 지금은 영화음악감독이 된 모 선배는 술은 못한다면서 고추장만 후룩후룩 마시기도 했다. 초고추장 제조 비밀은 밀린 외상값을 갚기 위해 포시즌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던 장승윤(90 철학) 전 총동문회 사무차장만이 알고 있을 게다. 한편 테이블에 앉자마자 서비스로 내주는 과자 ‘조리퐁’은 술값이 다될 무렵엔 메인 안주 반열까지 오르곤 했다.
포시즌에 우리 아버지가 떴다고?
포시즌은 주로 철학과와 언론연합회의 아지트였다. 그래서인지 사장님은 철학과 학생들의 외상에 유독 관대했다. 1990년 당시 철학과 신입생이었던 전계수, 이선영과 나는 3월 중순 포시즌에 가서 처음으로 외상을 여쭈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서강 전체 90학번 중에서 최초로 외상을 요청했다며 흔쾌히 허락해주셨다. 박영신(87 철학) 선배를 따라 처음으로 간 호프집이 포시즌이었고, 류준상(89 철학) 선배를 따라 낮술로 시작해 마지막 손님으로 일어났던 곳 역시 포시즌이었으며, 내 인생 외상 1호점도 포시즌이 된 셈이다.
철학과 90학번들이 1학년 2학기 때 소식지를 만든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소식지에 난 포시즌 광고를 보시고는 제 자식이 매일 살고 있다는 포시즌에 가보고 싶다며 어머니와 집을 나서셨다. 그날은 마침 필자가 전날의 과음으로 인해 일찍 집에 왔던 날이었는데, 종종 우리집까지 와서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와 합석한 적이 있기에 우리 부모님을 알아본 선배와 동기들이 나를 대신해 포시즌에서 부모님 술 상대를 해드렸다.
셔터가 내려지면 모든 게 공짜!
90년대 초반은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이었고, 술집은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다. 그래도 악동 단골들은 종종 사장님을 졸라 자정 이후 셔터를 내리고 마시자 했다. 셔터가 내려진 후에는 모든 술과 안주가 공짜였기 때문이다. 사장님과 종업원 형들은 그런 우리를 귀찮아 하면서도 셔터가 내려지면 우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그 대화는 마치 부모님이나 멋진 인생선배의 그것처럼 항상 따뜻했다. 하루는 셔터를 내리고 장승윤, 황윤교(90 철학)와 새벽에 차 다닐 때까지 맥주를 마시고선 집에 가려고 셔터를 올렸는데, 서강대 앞 도로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다. 얼큰하게 취한 우리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며 사장님과 종업원 형이랑 편 갈라 눈싸움 했다. 가장 흐뭇한 추억이다.
이규신 사장님은 장승윤과 필자에게 “요새 주량이 줄었다”며 처음으로 보신탕 맛을 보게도 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매년 포시즌 송년회에 고객 대표로 우리 둘을 초대해주셨다. 포시즌 송년회란 매년 12월 31일 밤 11시 포시즌 역대 종업원 형, 누나들과 함께 셔터를 내려놓고 밤새 사장님과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 그때 안주는 포시즌에서 가장 비싼 훈제 칠면조와 계절과일이었다. 그래서 군 입대하기 전까지 3년간 ‘MBC 10대 가요제’ 가수왕이 누구인지와 제야의 종소리 듣기를 포기하며 우리는 포시즌에서 새해를 맞았다.
아내에게 사귀자고 고백한 곳
나의 군 입대 기간 중에 이규신 사장님은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서 포시즌을 떠나셨지만, 난 마치 귀향 본능처럼 포시즌을 찾곤 했다. 지금의 아내에게 사귀자고 고백한 것도 포시즌에서 마시고 나선 직후였고, 두해 뒤 노래로 청혼하고서 들러리 친구들과 프로포즈 뒤풀이를 한 곳도 포시즌이었다. 다시 포시즌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다시 보고 싶다. 어떻게 살았고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 마셨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싶다. 맥주는 체질이 아니라고 투덜대면서도 포시즌에서 나와 함께 울고 웃었던 존경하는 故 박영미(89 철학) 누나, 창원에 있어 1년에 한번 보기 어려운 김상헌(90 철학)부터해서 말이다.
오세용(90 철학)
90년대의 추억 - 포시즌
학창 시절 술집 참 많이 다녔다. 1990년대 초반, 학교 정문과 청년광장을 바라보며 떡볶이 안주로 소주를 들이켰던 ‘물레야’, 모든 테이블이 투쟁가를 부르다가도 주인아주머니의 독창 때는 잠시 조용했던 ‘육교집’, 간판이 없어서인지 꼬막이 맛있어서였는지 여러 가지 설이 분분했던 ‘막집’, 라면이 맛있었던 ‘상림’, 과실로 만든 별주로 사람 여럿 쓰러뜨렸던 ‘사랑채’, 대학원에 들어가셔야 내 돈으로 먹을수 있었고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는 ‘동해횟집’, ‘노고산 숯불갈비’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내 단골로 삼았고 지난달에 들른 ‘투다리’와 ‘레이더스’ 등등…. 그럼에도 기억을 더듬어보니 90년대 내내 ‘포시즌(Four Season) 호프’에 충성했던 기간이 만 9년에 달한다.
쥐포 안주와 초고추장, 서비스 조리퐁 포시즌 호프는 서강대 정문에서 신촌 지하철역 방향으로 200미터 정도 내려가면 위치한 지금의 던킨도너츠 자리, 당시로선 글방 ‘서강인’과 전자오락실 사이에 있었다. 포시즌이 존재했던 10여 년간 네다섯 분의 사장님이 운영했다. 가장 인기 있던 안주는 88년경 처음 포시즌을 만들어 90년대 초반까지 운영한 이규신 사장님의 쥐포 안주였다. 90년 당시 1000원에 쥐포 다섯 장이 구워져 나왔는데, 다른 호프 집에서 내오는 것과는 맛이 비교가 안됐다. 쥐포 찍어먹는 묽은 초고추장도 맛있어서 지금은 영화음악감독이 된 모 선배는 술은 못한다면서 고추장만 후룩후룩 마시기도 했다. 초고추장 제조 비밀은 밀린 외상값을 갚기 위해 포시즌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던 장승윤(90 철학) 전 총동문회 사무차장만이 알고 있을 게다. 한편 테이블에 앉자마자 서비스로 내주는 과자 ‘조리퐁’은 술값이 다될 무렵엔 메인 안주 반열까지 오르곤 했다.
포시즌에 우리 아버지가 떴다고?
포시즌은 주로 철학과와 언론연합회의 아지트였다. 그래서인지 사장님은 철학과 학생들의 외상에 유독 관대했다. 1990년 당시 철학과 신입생이었던 전계수, 이선영과 나는 3월 중순 포시즌에 가서 처음으로 외상을 여쭈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서강 전체 90학번 중에서 최초로 외상을 요청했다며 흔쾌히 허락해주셨다. 박영신(87 철학) 선배를 따라 처음으로 간 호프집이 포시즌이었고, 류준상(89 철학) 선배를 따라 낮술로 시작해 마지막 손님으로 일어났던 곳 역시 포시즌이었으며, 내 인생 외상 1호점도 포시즌이 된 셈이다.
철학과 90학번들이 1학년 2학기 때 소식지를 만든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소식지에 난 포시즌 광고를 보시고는 제 자식이 매일 살고 있다는 포시즌에 가보고 싶다며 어머니와 집을 나서셨다. 그날은 마침 필자가 전날의 과음으로 인해 일찍 집에 왔던 날이었는데, 종종 우리집까지 와서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와 합석한 적이 있기에 우리 부모님을 알아본 선배와 동기들이 나를 대신해 포시즌에서 부모님 술 상대를 해드렸다.
셔터가 내려지면 모든 게 공짜!
90년대 초반은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이었고, 술집은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다. 그래도 악동 단골들은 종종 사장님을 졸라 자정 이후 셔터를 내리고 마시자 했다. 셔터가 내려진 후에는 모든 술과 안주가 공짜였기 때문이다. 사장님과 종업원 형들은 그런 우리를 귀찮아 하면서도 셔터가 내려지면 우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그 대화는 마치 부모님이나 멋진 인생선배의 그것처럼 항상 따뜻했다. 하루는 셔터를 내리고 장승윤, 황윤교(90 철학)와 새벽에 차 다닐 때까지 맥주를 마시고선 집에 가려고 셔터를 올렸는데, 서강대 앞 도로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다. 얼큰하게 취한 우리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며 사장님과 종업원 형이랑 편 갈라 눈싸움 했다. 가장 흐뭇한 추억이다.
이규신 사장님은 장승윤과 필자에게 “요새 주량이 줄었다”며 처음으로 보신탕 맛을 보게도 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매년 포시즌 송년회에 고객 대표로 우리 둘을 초대해주셨다. 포시즌 송년회란 매년 12월 31일 밤 11시 포시즌 역대 종업원 형, 누나들과 함께 셔터를 내려놓고 밤새 사장님과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 그때 안주는 포시즌에서 가장 비싼 훈제 칠면조와 계절과일이었다. 그래서 군 입대하기 전까지 3년간 ‘MBC 10대 가요제’ 가수왕이 누구인지와 제야의 종소리 듣기를 포기하며 우리는 포시즌에서 새해를 맞았다.
아내에게 사귀자고 고백한 곳
나의 군 입대 기간 중에 이규신 사장님은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서 포시즌을 떠나셨지만, 난 마치 귀향 본능처럼 포시즌을 찾곤 했다. 지금의 아내에게 사귀자고 고백한 것도 포시즌에서 마시고 나선 직후였고, 두해 뒤 노래로 청혼하고서 들러리 친구들과 프로포즈 뒤풀이를 한 곳도 포시즌이었다. 다시 포시즌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다시 보고 싶다. 어떻게 살았고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 마셨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싶다. 맥주는 체질이 아니라고 투덜대면서도 포시즌에서 나와 함께 울고 웃었던 존경하는 故 박영미(89 철학) 누나, 창원에 있어 1년에 한번 보기 어려운 김상헌(90 철학)부터해서 말이다.
오세용(90 철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